2017.04.19.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소식지팀이 공동체은행 빈고를 인터뷰하러 오셨습니다.
선물로 주신 <붓다로 살자>라는 책자에 실린 <붓다가 꿈꾼 공동체>라는 글에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인용합니다.
공동체들의 공동체인 빈고도 배우면 좋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.
사방승물 제도의 정신이라면,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훌륭한 공동체은행을 만드는 건 아주 쉬운 일일 것 같습니다 .
함께하면 좋겠습니다.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
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중시했던 붓다의 신념은 ‘현전승가’와 ‘사방승가’라는 불교만의 독특한 공동체로 꽃을 피웠다. 일정한 장소에서 살면서 포살 때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현전승가라 하고, 붓다의 법과 율에 의해 의지하는 공동체 전체를 사방승가라 한다. 현전승가는 삶과 수행을 나누며 서로 돌보는 작은 공동체, 사방승가는 시공을 초월한 모든 불교공동체를 아우르는 개념이다.
…
튼튼하게 자리 잡은 작은 공동체들끼리는 사방승가라는 느슨하면서도 열린 관계로 연결되었다. 사방승가 정신에 따라 누구든 승가를 옮겨와 다른 승가의 구성원이 되어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었다. 예컨대 종로 승가의 구성원들이 멀리 제주 승가에 가서도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었고, 이는 나라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도 마찬가지였다. 촘촘하게 짜인 기초공동체로서의 현전승가, 그리고 이 기초공동체들간의 느슨한 연대체인 사방승가, 이 승가의 조직 전통이야 말로 불교공동체의 청정성, 화합, 영속성을 가져온 원동력이었다.
…
붓다의 공동체관은 소유물을 다루는 원칙으로 뒷받침되었다. 승가공동체의 소유물을 승물이라 하는데, 이 승물은 현전승물과 사방승물로 나뉜다. 현전승물은 발우와 승복, 간단한 상비약 등 수행자들이 일상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말하고, 사방승물은 법당과 요사, 주방, 창고, 전답 등 공동체 전체가 사용하는 자산을 말한다. 쉽게 말하면 현전승물은 소소한 개인 소모품을, 사방승물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유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. 그런데 사방승물의 소유자는 개인도, 현존하는 공동체에 국한되지 않은, 시공을 초얼한 사방승가이다.
사방승물의 경우 당대의 불교공동체에게 재산의 처분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교의 재산은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. 규칙이나 엄격한 처벌규정으로 재산을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, 소유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꿈으로써 삼보정재를 보호한 붓다의 놀라운 지혜였다.
점유와 이용은 자유롭되, 소유와 처분은 함부로 못하게 한 사방승물 제도로 인해 출가수행자 개개인은 단순 검박하면서도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. 거주처를 옮길 때면 바랑하나 걸머지고 떠나면 그뿐이었다. 공동체의 재산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었기에 개인적으로 쌓아둘 이유가 없었다. 따라서 불교공동체는 분쟁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. 출가수행자들이 기나긴 불교역사 속에서 삼의일발로 상징도는 단순소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고귀한 수행 정신과 더불어 불교 특유의 공유문화 덕택이었다.
– <<붓다로 살자>> 2017년 통권 5호, <연재 : 붓다가 꿈꾼 공동체 2 (정웅기)> 중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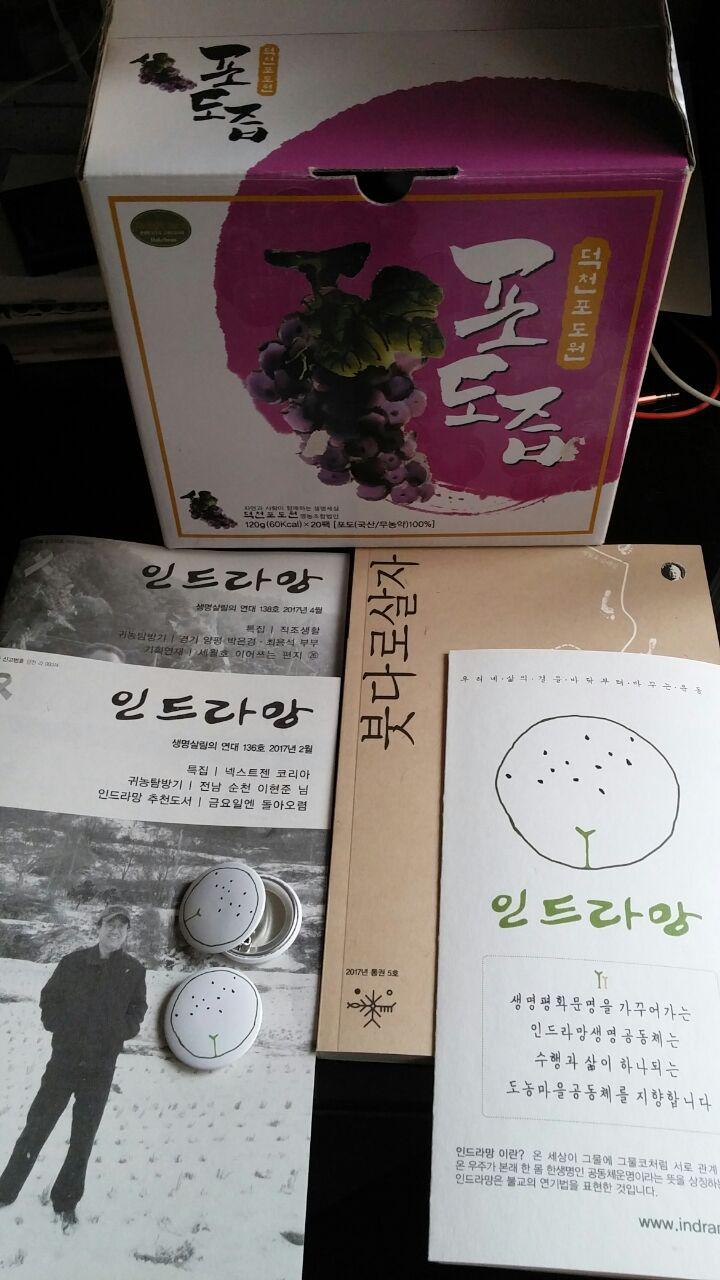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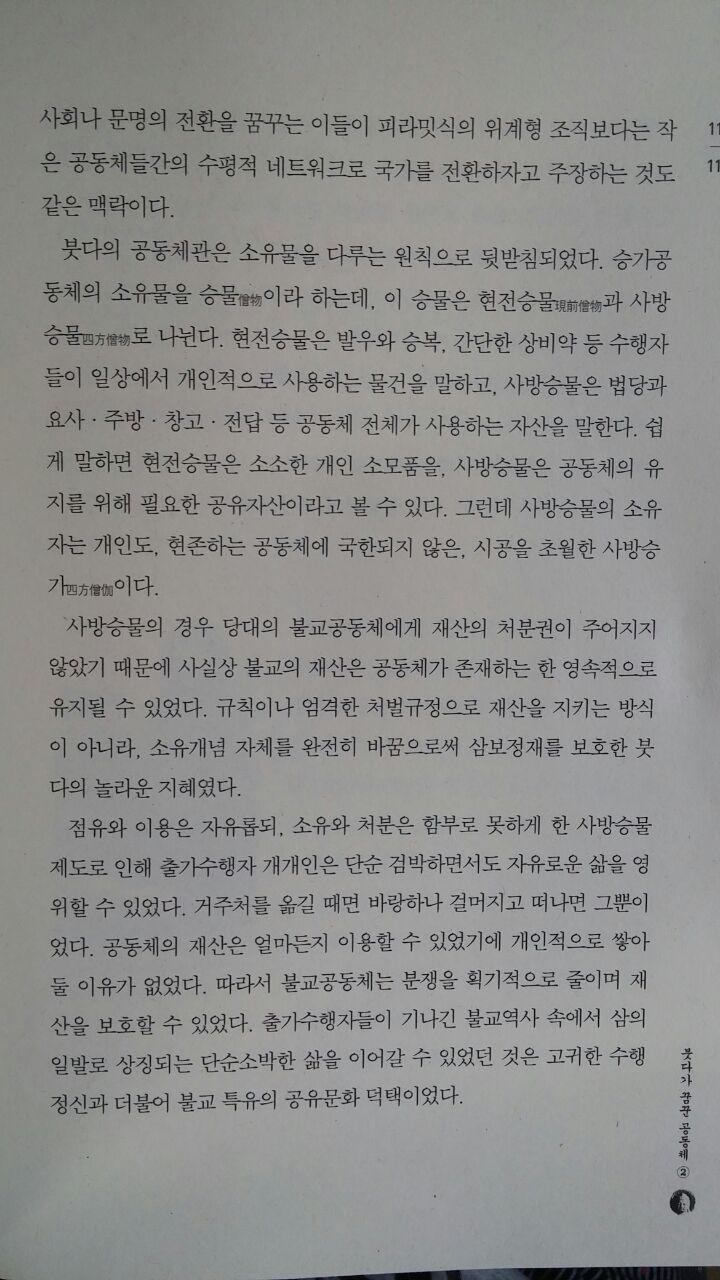
댓글
타인을 비방하거나 혐오가 담긴 글은 예고 없이 삭제합니다.